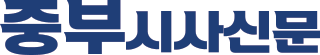여름이면 농촌 풍경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원두막'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극히 일부 지역의 농촌이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 풍경으로서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우리시에는 농촌 테마파크에 가면 볼 수 있다.
요즘은 농사도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기계화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의 모습도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어서 과거의 전원 풍경과 대조가 된다.
|
삼복 더위 때는 참외, 수박을 제일 많이 먹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 참외 수박 농사가 요즘은 하우스 재배로서 계절에 관계없이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어릴 적 농촌에서는 노지 재배로서 밭에 모종을 어 거름도 인분을 주고 농사 짓던 시절이다. '50년대만 해도 그랬다. 비료가 나온 것은 '60년대 초로 기억된다.
참외 수박 또는 콩국 물을 소위 '빠께스' 라고 하는 물통에 넣어 줄에 매달아 우물 속에 넣어 두었다가 꺼내 먹는 방식으로서 우물 물이 차갑기 때문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다.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라 더위를 쫓기 위해 부채를 사용하거나 냇가에 나가 물에 발을 담그거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이 피서의 전부였다.
하찮게 여기는 것을 표현 할 때 '개똥 참외 같다' 라는 말이 있다. 개똥 참외는 밭에 비료 대신 인분을 주어 인분 속에 들어 있던 참외 씨가 저절로 싻을 틔워 자라 열린 참외를 말하는데 알이 보통 참외보다 작았고 맛도 덜해서 '개똥 참외'라고 불렀다.
옛날 내 어릴 때는 남의 밭에 들어가 수박 참외 몰래 훔쳐 따 먹는 것을 '참외 서리', '수박 서리', '콩 서리' 라고 하였다.
배고프던 시절이라 먹는 것은 무엇이 되었던 훔쳐도 '서리'는 애교 쯤으로 치부하던 시절이라 서리하다 들켜도 경찰서에 고발 당하지 않고 혼쭐이 나거나 손해를 물어내는 것으로 그쳤다.
애써 가꾼 농작물을 도둑 당하는 것을 좋아 할 사람은 없다.
참외와 수박 밭에는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원두막이 있고 논에는 벼 이삭 낟알을 쪼아 먹는 참새 떼를 비롯한 각종 새를 쫓기 위해 '허수아비'를 세워 놓았다. 들판에는 원두막이 보이고 논에는 허수아비가 서 있는 풍경이야 말로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었다.
참외 수박이 주렁 주렁 매달려 익어갈 때쯤이면 원두막에서 주인은 밤낮 없이 지키는데 가족이 교대해 가며 지켰다.
어릴 때 동무(친구)들고 재미 삼아 어울려 '참외서리. 수박서리, 콩서리, 닭서리 등을 하기도 했다. 주인에게 들켜도 요즘처럼 사법 기관에 고발하지 않았고 어른들에게 야단 맞고 물어주는 정도에서 끝나곤 했다.
|
나도 친구들과 어울려 수박 서리에 가담했다가 덜미가 잡혀 어른들께 혼쭐이 난 적이 있다. '50년대만 해도 고무신 신발이 많았는데 보통 검정 고무신을 많이 신었고 고급 신발은 '지렁이 고무신'이었다. 지렁이한테는 민안한 말인데 쵸콜릿 색깔보다 엷은 지렁이 색깔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무신도 학교에 가면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어른들이 고무신에 굵은 실을 바늘에 꿰어 신발에 이름을 꿰메어 새겨 놓았다.
수박밭에 서리하러 몰래 들어갔다가 주인하테 들켜 달아 나다가 그만 땀에 고무신이 미끄러지며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새겨진 이름 때문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른들로 부터 혼쭐이 나고 수박 값을 물어준 적이 있었다.
원두막은 낮에는 뜨겁게 내려 쬐는 햇볕을 가려주어 밭에서 구슬 땀을 흘리며 일하다 땀을 식히는 쉼터로서도 훌륭했다.
나무 기둥 네개로 지줏대를 삼아 초가 지붕을 얹고 원두막 높이 중간에 널빤지를 깔아 고정시키고 사다리를 놓아 오르 내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망도 좋고 바람이라도 불면 시원하여 피서는 원두막에 앉거나 누워 있으면 저절로 되었다.
원두막에 앉아 수박이나 참외를 까서 먹으면 그보다 더 좋은 여름의 향연과 피서는 없었다. 밤에는 달려드는 모기를 막기 위해 모기장을 쳐 놓으면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이 그대로 학교이며 놀이터였다. 방학이면 논이나 들에 나가 메뚜기를 잡거나 개울에 나가 그물로 민물 고기를 잡고 지치면 개울이나 웅덩이에 발가 벗고 물어 뛰어 들어 미역을 감고 물놀이를 하면서 놀기도 했다.
웅덩이를 퍼내면 굵고 탐스러운 미꾸라지가 잡혀 미꾸리 탕을 끓여 먹기도 하고 민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다.
학교에서 숙제로 내 준 곤충 채집을 위해 들로 산으로 쏘다니기도 했다.
밤이면 쏟아질 듯 영롱하게 반짝이는 별빛이 손에 닿을 듯 가깝게 보였다.
찬란한 별빛을 원두막에 누워서 바라보는 그 정취는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원두막에는 호롱불 하나가 전부이고 그 호롱불마저 끄고 누워서 밤 하늘을 바라보면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별빛이 찬란하게 빛났다.
별빛을 볼 때 마다 애송하던 시(詩)로서 윤 동주 님의 <별 헤는 밤>이 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 후략 -
우리 집에도 뒷동산에 잇대어 있는 큰 수박 밭에 원두막이 있었다.
방학이면 원두막에 올라 책을 읽거나 친구들과 수박을 먹거나 낮잠을 자거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서였다. 원두막이 있는 집 친구들과 돌아가며 원두막에 놀러 다녔다.
중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수박과 참외를 안주 삼아 고리(소주를 내려 되로 팔던 시절 고리가 달린 옹기 이름) 술(소주)이나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사다가 파티를 열기도 했다.
내가 첫사랑 그녀와 마지막 데이트 한 곳도 원두막이었다.
군대 입대를 앞둔 어느 날 원두막에서 그녀와 나는 데이트 장소로 원두막을 택했다. 그 당시 빵집(만두집) 아니면 남`녀 학생들이 만날 장소가 없었는데 빵집에는 소위 깡패라고 불리우는 불량 학생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담배를 낟개로 팔기도 했다. '파랑새', '아리랑', '청자', '진달래', '도라지' 같은 새나 꽃 이름 등 자연에 관련 된 이름들이 생각난다.
그녀와 단 둘이 만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서는 원두막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다.
나는 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정신적으로 몹시 힘들고 방황하며 외로울 때였다.
그녀는 나에게 정신적인 의지처였다. 그녀와 헤어져 군에 입대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허전한 마음을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었다.
나는 어머니가 안계셨기 때문에 그녀에게서 모성애를 느꼈던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었다. 그녀는 나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었고 만날 때면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었다. 그것이 그때는 큰 힘이 되었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도 의논할 상대가 없던 시절이었다.
그녀와 헤어져 3년이란 세월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암담한 기분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원두막에서 가졌던 밀회는 그녀와 나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 해 가을 시월의 마지막 날, 나는 36개월의 긴 군대 생활을 위해 인천에서 군용 열차를 타고 진해로 떠나면서 그녀와의 인연은 막을 내리게 된결혼을 한 뒤였기 때문이다.
옛날 일이지만 연애 감정은 나에게 있어 '청춘의 용광로'와 같았다.
원두막은 나에게 있어 유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남다른 사연과 추억이 깃든 특별한 장소다.